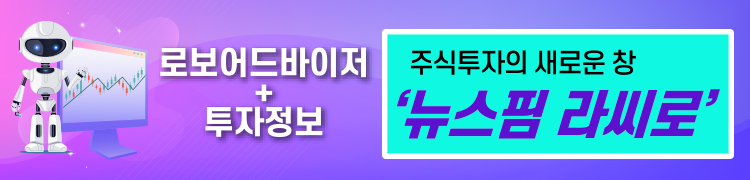[뉴스핌=김지나‧조아영 기자] 미세먼지 문제로 소비자들의 공기청정기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 정작 공기청정기 업체 중 정부가 제품 성능을 인증해주는 'KS마크'를 획득한 곳은 단 두 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청정기 업체들은 주로 민간협회에서 주관하는 'CA인증'을 받고 있지만 이 역시도 필수 인증 제도가 아니다. 결국 각 제조사들이 입맛에 맞춰 자체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공기청정기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국내 공기청정기 업체 중 KS인증을 받은 업체는 보성과 하영전자 두 곳뿐이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한 나머지 업체들은 민간협회인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주관하는 CA인증을 받거나 어떤 인증도 받지 않았다.
현재 국가기술표준원은 공기청정기 한국산업표준으로 'KSC 9314'을 마련하고 있지만 인증을 신청하는 업체가 없어 유명무실하다.
공기청정기 업체들이 KS인증 대신 CA인증을 선호하는 이유는 KS인증을 받을 경우 정기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하고, 검증을 받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기청정기 제조사들은 KS인증을 받으려고 악착같이 뛰어들지 않는다"면서 "삼성과 LG 등 대기업들은 어떤 인증을 받건 상관없고, 또 작은 업체들은 인증 기준 자체를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현재 시장에 출시된 공기청정기 가운데 삼성전자의 '삼성큐브', LG전자의 'LG퓨리케어 360°', 코웨이 '액티브액션 공기청정기 IoCare', 대유위니아 '위니아 자연가습 공기청정기' 등이 CA인증을 받았다.
하지만 CA인증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CA인증이 공기청정기를 검증할만한 객관적인 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CA인증은 청정 능력 위주로 성능을 시험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내세우는 특수 성능은 인증되지 않는다"면서 "인원이 늘어나거나 사용 조건이 나빠지면 공기 정화 능력이 바로 떨어지는데 이 같은 다양한 변수들을 담지 못한다"고 귀띔했다.
CA인증은 올해 2월까지 공기청정기의 용량과 상관없이 30㎥의 동일한 실험실에서 청정화능력, 유해가스 제거효율, 오존발생농도, 소음 등의 검증이 이뤄졌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며 주로 방안에 있던 공기청정기는 거실까지 나왔다. 이에 공기청정기 업체들은 2014년부터 대용량 공기청정기를 출시하기 시작했지만 그동안 용량별 효율을 검증할 만한 기준이 마련되지 못했던 것이다.
한국공기청정협회는 올해 들어 기준을 개정해 3월부터 실험실을 8㎥, 30㎥, 50㎥ 세 가지 종류로 세분화해 공기청정기 용량별로 검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중에 출시된 대용량 공기청정기, 삼성전자 '블루스카이9000', LG전자 '퓨리케어' 등은 과거 실험실 기준인 30㎥ 실험실에서 검증해 CA인증을 받았다.
여기에 필터형 공기청정기와 다른 기술 방식의 음이온 공기청정기를 검증할만한 기준도 없어 음이온 공기청정기에 대한 검증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임영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은 "음이온 공기청정기는 시중에서 고가에 판매되고 있지만 음이온 방식은 무조건 오존이 생성될 수밖에 없고, 오존이 몸에 닿으면 해롭다"면서 "제품을 작동시키고 40~50분에 한번 씩 창문을 열고 공기를 환기해줘야 하는데 소비자들이 이런 사용 요령을 읽고 실천에 옮기는 경우가 드물다"고 지적했다.
한국공기청정협회 관계자는 "필터식, 음이온식 등 분류와는 무관하게 공기청정기 제품 자체를 가동해서 성능을 시험 한다"며 "오존 기준은 0.03 ppm 이하이면 적합이며, 기준 이상 높게 나오면 부적합 판정을 한다"고 설명했다.
김상걸 국가기술표준원 사무관은 "CA인증 요건을 보면 KS와 별반 차이가 없는 수준"이라며 "KS인증을 강제하게 되면 기업에 엄청난 규제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고, 품질 성능 인증을 강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abc123@newspim.com)
 영상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