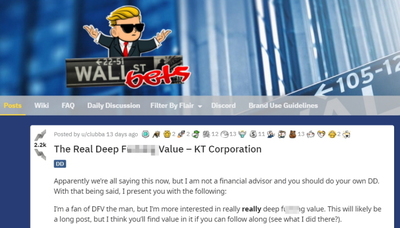[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주식종목토론방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같은 통신주들은 속어로 '똥신주'라 불린다. 아무리 장이 좋아도 주가가 요지부동이라서다.
26일 종가 기준 SK텔레콤의 주가는 27만4000원, KT는 2만8300원, LG유플러스는 1만2450원이다.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인터넷 기업들이 1년간 주가가 200~300% 뛸 동안 SKT, KT, LG유플러스는 50% 가량 오르는 데 그쳤다.
이통사 경영진도 이를 모르지 않는다. 그래서 최근 이들의 최대 화두는 '주가 부양'이다.
이들은 연초 실적발표 후 증권사들이 개최한 IR에 참석해 "올해 주가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증권사 IR에서 주가 상승의지를 밝히는 것은 당연한 듯 보이지만 이번에는 과거와 분위기가 달랐다는 것이 그 자리에 있었던 애널리스트의 전언이다. 특히 통신 아닌 신사업을 강조하며 '엉덩이가 무거운' 통신주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했다.
지난해 가장 눈에 띄는 실적을 보였지만 주가 변화는 가장 적었던 LG유플러스가 대표적이다. LG유플러스 경영진은 최근 증권사 대상 IR에서 스마트팩토리, 스마트SOC, 스마트시티, 스마트산업단지 등 기업간거래(B2B) 쪽 네 분야를 본격적으로 공략하겠다고 강조했다. LG전자 등 생산시설을 갖춘 LG그룹 계열사들에 스마트 팩토리를 적용하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단다.
SK텔레콤도 미디어, 보안, 커머스, 모빌리티 등 비통신 신사업을 분사하고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이다. 전날 주주총회에서 박정호 대표는 연내 물적분할을 통해 지배구조를 개편, 주가가 SK텔레콤의 포트폴리오를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다고도 했다.
KT는 이통3사 중 가장 적극적이다. 취임 직후 "주가에 기업가치가 반영되지 않는 것이 고민"이라 할 정도로 주가에 신경쓰던 구현모 대표는 KT파워텔을 매각하고 현대HCN을 인수하는 등 계열사 사업구조 재편부터 시작했다.
하지만 이통사들의 '통신 색 빼기' 노력과 달리 정작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건 '배당금'과 '디즈니'라는 호재 덕이 컸다. 지난 1월 컨퍼런스콜을 통해 배당금 확대 정책을 발표한 뒤 주가가 상승세를 타자, KT는 지난 23일 이 기세를 업고 구 대표가 직접 나서 스튜디오지니의 청사진을 밝혔다.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다"면서도 "루크 강 월트디즈니 아시아태평양지역 총괄사장과 많이 대화하고 있다"며 구 대표가 디즈니플러스 제휴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높이니 지난 24일에는 올 들어 두 번째 신고가를 경신했다.
SK텔레콤 역시 전날 주총에서 인적분할과 분기 배당 확대 정책을 발표한 뒤 하루가 지난 26일 종가는 전일대비 8% 상승한 27만4000원에서 마감했다. 바꿔 생각하면 SK텔레콤의 신사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치는 아직 높지 않다는 의미다.
얼마 전 "CEO가 비통신 신사업 부서에 힘을 주니 서로 그 부서를 가려고 하지 않느냐"고 이통사 관계자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그러자 그는 '모르는 소리를 한다'는 표정으로 오히려 새 조직들은 사람을 못 구해 난리라고 했다. 언제 없어질 지 모르는 부서에 제 커리어를 바치려는 직원이 누가 있겠냐는 거다. 수년전 이통사가 유행처럼 만들었던 조직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라고도 했다.
이통3사가 아무리 신사업 위주로 계열사를 정리하고 조직을 개편하고 인재를 영입해도 '배당금'이나 '디즈니플러스' 같은 단어가 주가에 더 영향을 주는 이유는, 어쩌면 그때 그의 대답에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 이통3사 CEO들은 '빅테크' '디지코' '탈통신'을 입버릇처럼 강조하지만, 실제로 통신사를 넘어 디지털, 테크기업이 되겠다는 이통3사의 지난해 평균 연구개발비는 네이버, 카카오 평균 연구개발비의 19분의 1에 불과했다. 슬로건만으로 신사업이 회사에 뿌리내리기는 어렵고, 내부 직원들조차 확신을 갖지 못하는 신사업이 투자자를 설득할 수도 없는 일이다.
nanana@newspim.com
 영상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