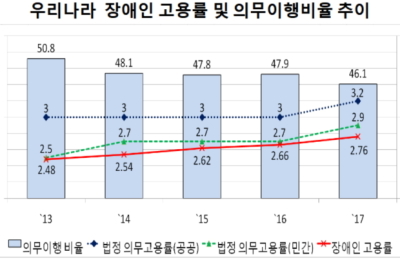[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장애인활동보조 직계가족도 허용해 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장애인가정에서는 활동보조인을 구하지 못하여 온전히 가족이 돌보는 경우도 있고, 설사 활동보조인을 구해 이용하더라도 서로 마음에 맞지 않아 관두는 경우도 있다"며 직계 가족도 활동보조인 자격을 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무려 7040명이 참여하며 힘을 실었다.
이처럼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제도 개선은 더디기만 하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예산은 △2016년 5009억원 △2017년 5461억원 △2018년 6907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예산까지 합치면 올해 기준 1조원이 넘는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지원대상도 △2016년 6만1000명 △2017년 6만5000명 △2018년 7만1000명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활동보조인도 △2016년 5만5309명 △2017년 6만294명 △2018년 6만4863명으로 늘어났다.
이렇듯 제도가 외형적인 성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의 문제점들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활동보조인의 낮은 단가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올해 시간당 단가는 평일기준 1만760원이며 활동지원기관의 몫인 수수료 25%를 제외한 활동보조인의 임금은 이중 75%인 807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인 7530원을 웃도는 수준이지만 법정수당인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복지부에서 매년 시간당 단가를 인상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인상률과 비교하면 인상폭 격차가 크다.
이처럼 활동보조인의 열악한 급여 수준 탓에 청년층 보다는 장·노년층이 주로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여성과 남성 비율도 9대1에 달한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물리적인 힘은 물론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요구된다. 활동보조인들이 중증장애인과의 매칭을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다.
그러면서 중증장애인들이 활동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앞서 직계가족의 장애인활동지원을 허용해달라는 청원 역시 이러한 맥락에 따른 주장이다.
이에 복지부에서 2016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고 최중증장애인을 보살피는 활동보조인에게는 시간당 680원의 추가수당을 제공하기로 했지만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복지부가 지정한 최중증장애인의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수당 금액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활동지원기관 관계자는 "시간당 단가가 똑같은데 활동보조인이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증장애인을 선호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며 "최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보조인에게는 추가 수당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금액이 적다보니 실제로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기관 관계자도 "현재의 활동보조인 단가로는 활동지원기관을 운영하면 할수록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무작정 예산만 늘릴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만 65세 이상 노인부터는 노인장기요양으로 전이돼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점 △신체장애에만 초점을 맞춘 불평등한 지원 등급 기준 등의 문제점도 제도 이용을 원하는 중증장애인들의 걱정거리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예산 규모도 크고 지원시간을 많이 보장하는 복지제도에 속한다"면서 "현장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예산 제약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영상
영상